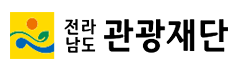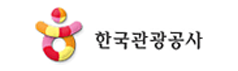264. 영혼과 혼령, 제사에 담긴 유학자의 고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활력연대 작성일 23-06-21 17:18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영혼과 혼령, 제사에 담긴 유학자의 고민
2023년 6월 19일 (월)
글쓴이 / 백 민 정(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다산연구소 <dasanforum@naver.com> 풀어쓰는 실학 이야기
18세기 이후 조선 사람을 고민하게 만든 대표적인 서양의 철학적 개념은 ‘천주(Deus)’와 ‘영혼(Anima)’이었다. 특히 인간의 지성적 혼을 의미하는 서구 중세철학의 ‘아니마 후마나(anima humana)’ 개념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다.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서양 신부들은 신의 형상을 모사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 제각기 고유하며 죽은 후에도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의 혼을 번역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했다. 1584년 선교사 미켈레 루기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 1543-1607)가 제안한 ‘아니마’의 첫 번역어는 혼령(魂靈)이었다. 뒤이어 중국에 입성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는 유명한 작품 『천주실의』에서 영혼(靈魂)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혼령이든 영혼이든 한자어 혼(魂)은 음양 두 기(氣)의 작용으로 이해되는 귀신을 의미했다. 신유학자들은 펼쳐지며 확장되는 신령한 기운을 신(神)이라고 했고 수축하고 모여드는 기운을 귀(鬼)라고 했다. 요컨대 유학자들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 혼과 백(魄)을 모두 음양의 작용으로 펼쳐지는 귀신의 모습이라고 여겼다.
한자어 혼 개념이 음양의 기운을 가리켰기 때문에 철저히 비물질적이며 사멸하지 않는 인간 영혼의 번역어가 될 수 없다고 우려한 후배 선교사들은 한때 ‘아니마’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한자어 ‘아니마(亞尼瑪)’를 영혼의 번역어로 사용했다. 1624년에 출간된 프란시스코 삼비아시(Francesco Sambiasi, 畢方濟, 1582-1649)의 『영언여작』이 이런 방법을 선호했다. 그러나 인간 영혼의 음역에 만족하지 않았던 신부들은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낸다. 줄리오 알레니(Julio Aleni, 艾儒略, 1582∼1649)는 자신의 서학서(西學書)에서 영혼 개념을 비롯하여 영성(靈性), 성령(性靈), 영신(靈神), 영명(靈明), 신명(神明), 신령(神靈) 등 다양한 후보군을 ‘아미나 후마나’의 번역어로 제시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번역된 선교사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의 작품 『주제군징』, 이곳에서 아담 샬은 영혼의 번역어로 신체(神體), 즉 신령한 본바탕을 선택했다. 이와 유사하게 니콜라스 롱고바르디(Nicholas Longobardi, 龍華民, 1559-1654)도 신체(神體) 그리고 영체(靈體:영묘한 본바탕), 영명지체(靈明之體)를 영혼의 번역어로 제시한다. 영원하고 비물질적인 ‘아니마’를 알리기 위한 번역어 ‘영혼’ 개념의 계보사라고 할 만하다.
『중용장구』에서 주희는 귀신(鬼神)을 천지의 공용(功用), 즉 천지 음양 기운의 작용이자 기(氣)에 기반한 조화의 자취라고 풀었다. 신유학자들은 인간과 만물을 형성하는 음양의 기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며 한 개체가 소멸하면 그를 이루던 기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들은 조상과 나[후손]의 기운이 같기 때문에 내가 정성으로 공경을 다 하면 조상의 혼령이 돌아와 감응하는 이치가 있다고 말한다. 가령 조상이 사망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혼백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때라면 내가 제사 지낼 때 조상의 혼이 후손인 나의 정성에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 사망했다면 그 조상 혼령의 기가 남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주희는 조상과 후손이 감응하는 이치[理]는 존재하지만, 이미 흩어진 조상의 기(氣)는 다시 모이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조상 혼의 영원성뿐만 아니라 개체성, 고유성도 부정했다.(『朱子語類』권3, 19조목).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는 유학자의 혼 관념이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지목했다. 리치는 귀신과 조상의 혼이 기(氣)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귀신에게는 제사를 지내지만 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법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조상의 혼과 귀신은 결코 음양의 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치는 유학자들이 오랜 제사의례 전통을 가졌음에도 사후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은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한다. 끝내 망자의 혼이 모두 사라져서 후손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면 당신들의 제사의례라는 것은 공허한 유희에 불과하다고 본 리치의 지적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었다. 19세기 영남 유학자, 이상정(李象靖:1711~1781)과 그의 제자 남한조(南漢朝:1744~1809), 조술도(趙述道:1729~1803), 정종로(鄭宗魯:1738~1816), 류건휴(柳健休:1768~1834) 등도 서학서가 던진 질문에 봉착해서 귀신과 혼령을 고민했고 제사의 의미를 다시 숙고했다.
특히 남한조는 서양 천주학에서 말한 인간 영혼의 불멸에 대한 관점을 ‘영신불멸설(靈神不滅說)’이라 부르며 비판했다. 아니마의 번역어로 영신(靈神)을 사용한 것은 줄리오 알레니의 저작인데 조선에서는 경기 남인들, 이익(李瀷:1681~1763)과 안정복(安鼎福:1712~1791)의 글에서 이 용어가 자주 보인다. 특히 안정복은 『천학문답』에서 영혼과 영신 개념을 수시로 언급했다. 남한조는 안정복의 글을 비평하면서, 영신[혹은 영혼]은 생명과 지각 작용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의 혈기가 사라지고 기의 영명하고 신령한 지각 작용이 사라지면 영신도 소멸한다고 말했다(『損齋先生文集』권12, 「安順庵天學或問辨疑」). 그는 인격성을 띠고 의지 작용을 하는 혼은 그것이 어떤 부류의 혼이든 결국 신령한 기의 운명과 생사를 같이 한다고 보았다. 영남 유학자들이 생각한 영신에는 인간의 개별 혼뿐만 아니라 천주도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천주가 주재하고 심판하며 상벌을 주관하는 인격성을 띠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에게 이런 의미의 인격성은 지각 운영을 겪는 유한한 존재의 특성일 뿐 공경과 존모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서학서의 영혼, 영신 개념을 비평하면서 유학자들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본 점이다. 위의 글에서 남한조는 “사람이 죽어서 기가 흩어지면 사라지지 않는 신(神)이 없는데 다시 조상의 신령이 돌아와서 흠향한다고 하니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과연 어떤 부류의 신인가?”라고 자문한다. “우리가 말하는 신(神)은 이치[理]에 근거하여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말하니 그것은 우리가 부르면 모이고 흠향하게 하면 이른다. (...) 무릇 지각 작용과 영신(靈神)이 불멸한다는 관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아야, 비로소 제사에서 신(神)이 이르는 것은 사람의 정성으로 부를 때만 신령이 감응해서 도래하는 이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安順庵天學或問辨疑」]
남한조를 비롯한 영남 유학자들은 모든 기는 생생불식(生生不息)하며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치[理]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유학자에게 신기(神氣), 즉 조상의 혼령과 나의 신기가 서로 감응하게 하는 이치는 영원하고 보편적이지만 신기 자체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신기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다시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오래전 생겨난 조상의 혼도 결국 소멸한다. 남한조를 비롯하여 19세기 영남 유학자들은 이런 이치를 자각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자의 마음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제례에 임하는 자가 공경과 정성으로 부르면 이치에 따라서 제사의 대상이 이곳에 이른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가 부르면 혼이 모이고 흠향하도록 초대하면 이곳에 이른다고 남한조가 말한 것도 이런 의미다.
그렇다고 이것이 귀신의 현상을 모두 내 마음의 주관에 함몰시킨 발상은 아니다. 유학자에게 이치[理]와 기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치가 있으면 기도 이곳에 함께 있다. 대신 그들은 개별적인 조상의 혼이 아닌 ‘공공지기(公共之氣)’를 말한다. 혈기로 이어진 조상 혼은 소멸해도 조상과 후손을 낳는 천지일기(天地一氣)의 흐름은 끊이지 않는데, 그것은 이치가 새로운 기를 끝없이 생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치의 보편성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기를 ‘공공지물(公共之物)’이라고 불렀다. 천지와 산천, 성현들은 비록 내 조상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주체가 되어 그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나와 제사의 대상이 서로 관련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정성으로 신혼(神魂)을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들은 조상이든 성현이든 내가 제사를 지내서 제사의 대상과 감통하는 것은, 결국 이치[理]가 그들을 공경하고 섬길 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점에서 마음의 이치가 합당해야 내가 만나는 신(神)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영남 유학자들은 서학서에서 강조한 인격적 영신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믿어온 귀신과 조상 혼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숙고했다. 같은 집안의 후손이 같은 기로 상응하는 조상의 혼령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본 의례의 협소한 의미를 벗어나 제사의 공적 가치,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려는 노력이 그들의 사유에서 엿보인다.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수많은 서양 책들은 유학자들의 지적 자의식을 동요시키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누군가는 서학서에 깊이 경도되었고 한편으로 누군가는 이단을 논파하기 위한 척사론, 벽이단론을 작성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또 다른 길에 있지 않았을까? 서양 책은 조선 지식인들이 스스로 믿어온 다양한 신념을 반성하도록 자극했다. 그리고 좀 더 세련된 감각으로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가치를 재해석하도록 촉구했다. 이치의 보편성, 이치에 기반한 음양 귀신의 공공성은 유학자들의 사유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었을까? 이것이 요즘 내가 고민하는 한 가지 철학적 물음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